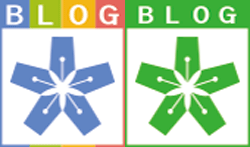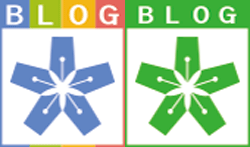갯골생태공원에서 만나는 염생식물
국가해양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골생태공원은 갯벌을 막아 소금을 만들던 소래염전으로 1996년까지 소금을 만들던 곳이었다. 이후 폐염으로 버려지다시피 하던곳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가 회복되고 다양한 생물상들을 확인하면서 시흥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곳으로 태어났다.
지금도 바닷물(해수)이 하루 두차례씩 드나들고 물왕저수지에서 흐르는 민물(담수)이 보통천을 따라 연꽃테마파크를 거쳐 이곳 시흥갯골에서 두 물이 합쳐져 기수역을 이루는 곳으로 생태적으로도 훨씬 우수한 생태계를 지닌곳이다.
소금기가 있는 곳은 식물이 살기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도 살아가는 식물이 있다. 이름하여 염생식물이라 통칭한다.
염생식물들은 힘든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대개 잎이 통통하거나 몸속에 쌓인 소금기를 밖으로 내보내므로 잎에 하얀 소금기가 묻어있다. 또한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 잎의 갈래를 가늘게 하거나 영양분을 아끼기 위해 꽃잎을 만들지 않는다.
시흥갯골 또한 이런 염생식물들이 모여 또다른 장관을 이루는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몸의 마디마디가 통통해 ‘퉁퉁마디’라 불리는 이식물은 씹어보면 짭짜름한 맛이 나는데 한자로 짤 ‘함’자를 써서 함초로 불린다. 잎이 퇴화해서 없으며 가지는 줄기에 쌍둥이처럼 마주 달린다. 염분이 가장 많은곳에서 볼 수 있다.
칠면초는 바닷물이 아주 얕게 고이거나 질퍽거리는 모래나 자갈 섞인 갯벌에서 자라는데 봄이면 새싹이 자주빛을 띄다가 자라면서 광합성을 위해 초록빛으로 변한다. 그러다 다시 가을이 오면 자주빛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몸의 색깔이 다양한 색으로 바뀌므로 시흥갯골의 특별한 장관을 만들어 내는 주역이다.
나문재는 예전에 나물로 밥상에 오르던 식물로 나물로 만들어 먹어도 남았다 하여 나문재라고 불린다. 고려시대 <청산별곡> 중 ‘나마자기’가 ‘나문작이‘ 등으로 변해 굳어진 이름이라 한다. 잎이 솔잎처럼 빽빽이 달려있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다.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자라다 줄기 아래부터 차츰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다.
해당화는 바닷가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로 시흥갯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가수 이미자의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에’ 나오는 해당화는 해설할때 가끔 해설자료로 쓴다. 향기가 대단히 향기롭고 늦게 까지 남아있는 열매가 인상적이다.
순비기나무도 만날 수 있는데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식재한 식물로 ‘숨비’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숨을 비우고 들어간다는 뜻인데 잠수병에 탁월한 표과가 있다고 하여 불리는 이름이다. 잎의 특유한 향기는 향수나 방향제로 이용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염생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가을이 가기전 염생식물을 만나러 시흥갯골로 여행을 떠나보자. /주간시흥 기자 박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