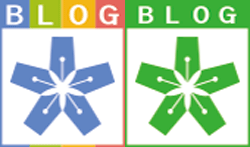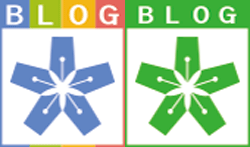밤나무와 닮은 듯 다른 듯
전설로 내려오는 나도밤나무, 너도밤나무
2005년경 숲 해설 공부를 마치고 산림과학원 내 홍릉수목원에서 숲 해설 자원봉사를 시작할 무렵이다. 공부를 위해 찾은 국립산림과학원 내 나무들을 보면서 생소한 이름을 가진 나무들을 하나씩 구분해 나가는게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음을 지금 돌이켜 보아도 현기증이 날 것 같다. 비슷한 잎, 비슷한 수형에 비슷한 이름들....
그래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로 한 달에 몇 번씩 집 앞에서 버스 타고 소사역까지 이동해서 전철로 청량리역까지, 다시 산림과학원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여정을 반복했더랬다.
그즈음 산림과학원 내 밤나무,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는 재미있는 숲해설 자원이 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구별할 줄 몰랐다.
밤나무야 많이 접하던 나무라서 눈에 익숙했지만 그 외 나무들은 처음 보는 나무들이서 그게 그거 같았다. 고백하자면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식물학자는 아니라는 핑계로..
6~7살 무렵이었나보다. 새벽에 눈을 비비고 고모들을 따라서 뒷동산으로 올라가 아침 이슬 촉촉한 숲 바닥을 스윽 훑어보면 여기저기 알밤들이 툭툭 떨어져 있어 밤 줍는 재미가 쏠쏠 했다. 밤새도록 바람에 흔들리고 가지에 부딪히며 알밤이 툭 떨어져 있을 것 같아 매일 찾아가던 뒷동산 밤나무는 이제 그 집 꼬맹이들은 다 자라 도시로 나가고 밤나무만 홀로 덩그라니 남아 알밤은 주워가는 이 하나 없는 숲 동물들의 먹이자원이 되었다.
소래산산림욕장 올라가는 초입 넓은 공간에도 밤나무가 제법 몇 그루 남아 있었다.
숲 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아이들 기다리는 시간이 좀 남아 한 바퀴 도는데 툭 소리가 나서 둘러보니 제법 튼실한 밤송이가 떨어져 있었다. 위를 보니 청서 한 마리가 밤나무의 맨 위로 올라가 아래로 떨어트린 것 같았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밤송이를 얼른 주워 숨겼다. 청서는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치 ‘이상하네, 분명히 떨어뜨렸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 라고 하는 듯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이쪽저쪽을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혼자서 실컷 웃었더랬다.
나도밤나무, 너도밤나무 이야기를 하자면 율곡이 강원도 강릉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 어느 한 도사가 율곡의 집 앞을 지나다가 율곡의 관상을 보더니 곧 죽을 운명이라고 하였다.
밤나무 천 그루를 심으면 그 운명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자 율곡은 열심히 뒷동산에 천 그루 밤나무를 심었겠죠? 얼마 후 도사가 찾아와 산에 올라가 밤나무를 세어 보니 두 그루가 모자라는 것이었다. 도사는 약속과 다르니 호랑이로 변신해 율곡을 잡아가려는 순간 저 멀리서 ‘나도 밤나무요’나서 주었는데 그래도 한 그루가 모자랐다. 그때 저 멀리서 ‘나도 밤나무요’ 하더란다. 도사는 ‘너도 밤나무냐?’ 인정하여 호랑이로 변해 도망치고 율곡은 자라서 훌륭한 학자이면서 정치가가 되었다고 한다.
‘나도 밤나무요’하고 하고 외친 이 나무는 모양새가 진짜 밤나무와 매우 닮았다고 하여 사람들이 이 나무를 ‘나도밤나무’와 ‘너도밤나무’로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