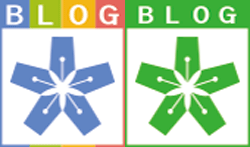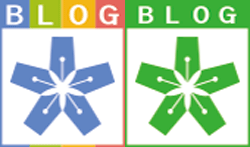일요일 아침이다. 책놀이터에도 안가는 날이라 게으름을 피워볼까 잠시 고민하다가 장화를 챙겨신고 밤나무 아래로 갔다. 밤도 해걸이를 하는지 크기가 작년만 못하다. 작은 알들은 다람쥐 밥으로 남겨두고 큼직한 것들만 주워서 바로 삶아 스님들과 맛있게 먹었다. 달콤하고 폭신한 가을 맛이다.
어릴적 엄마랑 둘이서 살던 시절이 있었다. 이 즈음이었는지 엄마가 아침에 밤을 주워다가 저녁마다 조금씩 삶아주셨다. 감자나 고구마보다도 훨씬 맛있었다. 어린 나는 좀 더 많이 먹고 싶은 생각에 엄마보다 일찍 일어나 뒷마당에 가서 밤사이 떨어진 밤을 잔뜩 주워왔다. 깜짝 놀라신 엄마는 밤을 몇 알만 남기고 다시 나무아래에 던져두고 들어오셨다. 그날 저녁에도 딱 어제 만큼만 밤을 삶아 주셨다. 주전부리가 부족했던 그 시절, 삶은 밤이 나에게는 늘 아쉬운 맛이었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우리가 살던 집은 친구 춘옥이네 집이었고 밤나무도 춘옥이네 밤나무였던 것이다.
몇 해 전 가을날 이웃에 사는 송암동산 아이들이 손가락에 밤가시가 들어갔다며 나를 찾아왔다. 가시를 빼주고 절에 있는 삶은 밤을 한웅큼씩 쥐어서 돌려보낸 일이 있다. 잠시 머물다가 한주먹 밤에 좋아서 통통 뛰면서 돌아가는 모습에 내 기분도 좋았다. ‘아아,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는 갈 곳이 없는거구나. 여느 아이들과 다르게 친구들 집이 가깝지 않으니 그렇겠구나.’
사찰이야 일부러 한적한 곳에 자리잡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안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놀이터를 만들게 되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자주 놀러와서 참 좋다.
내가 스님이 되고부터 시골에 사시는 모친께서 해마다 잊지 않으시고 보내주시는 게 있다. 우리 막내딸스님은 고기를 못먹으니까 하시며 잣과 함께 밤을 보내오신다. 두고두고 혼자만 먹으라고 당부도 늘 하신다. 어린 딸에게 그 흔한 밤도 실컷 먹이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리신다는 말과 함께. 올해도 노모께서 며칠 동안 산에 다니시며 주워 보내신 밤을 송암동산 아이들과 나눠먹었다.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지금도 팔순 노모에게 여전히 나는 막내딸이다. 가평은 이곳보다 가을이 빨리 찾아올텐데 평안하신지 안부전화라도 드려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