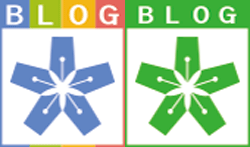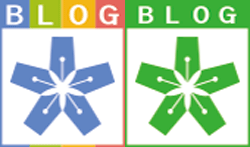이 글은 지난 8일 문화방송(MBC) 여성시대에 소개된 글입니다.〕
“아름아, 집에 안 가? 어두워지는데.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며칠 전,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와 놀고 있는 딸아이 친구에게 말을 걸자 둘 다 마지못한 듯 느릿느릿하게 일어섰습니다.
더 놀고 싶은데 집에 가라고 하는 제가 야속한 듯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겠지. 근데 엄마 더 놀면 안 돼?"
하며 절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니, 집에서 걱정하시잖아. 곧 어두워져. 그리고 아름아, 엄마 직장에서 늦게 오시니?"
제 말에 딸아이가 또 나섰습니다.
“엄마, 아름이는 엄마가 없어. 맞지?"
딸아이의 말에 제가 아차, 하는 사이 아름이가 머뭇대며 말했습니다.
“엄마는요, 서울에 돈 벌러 갔어요. 아빠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랑 만 살아요......"
“으 응.....그렇구나. 할머니가 걱정하시겠다. 내일 또 만나서 놀자 응? "
"네...... 안녕히 계세요."
아름이가 저를 향해 꾸벅 절을 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딸아이와 서로 잘 가, 라는 인사를 하는 지연이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괜한 말을 해서 지연이의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아이는 친구와 하던 놀이를 계속 하자며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딸아이가 아름이를 집에 데리고 온 건 학기 초부터 였습니다.
키가 큰 딸아이와 달리 아름이는 키가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해서 늘 어깨를 덮고 있어서 단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바쁜가 보구나,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밝은 분홍색의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는 사고 나서 한 번도 세탁을 안 했는지 때가 묻어 꼬질꼬질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여 지던 아름이의 모습들이 모두 오늘에 와서야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두 거침이 없는데 아름이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간식을 줘도 제 눈치를 보고 나서 먹고, 딸아이와 집을 들어서면서도 제 눈치를 보며 딸아이 등 뒤에 붙어 들어서곤 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장난감 놀이를 할 때도 늘 소극적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소극적이고 머뭇댄다고 생각한 딸아이보다 더한 아름이를 보고 그동안 딸아이의 성격을 걱정한 마음을 조금 접고 안심한 적도 있었는데.....
딸아이와 놀다가도 집에 가라고 하면 순간 어두워지던 눈빛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안의 공기, 그 쓸쓸하고 텅 빈 느낌을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다 감당할까, 라는 생각이 저녁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 늘 일에 치여 살던 엄마가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집 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언니나 동생이 있어도 엄마가 없는 집 안의 공기는 늘 뭔가 허전하고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도 그 허기를 어쩌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머뭇대고 자신 없어 하는 거겠지요.
엄마라는 허기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지난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등교하고 난 후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파트 하수구가 감당하지 못해 거의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어 우산을 챙겨들고 딸아이 학교로 갔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뚫고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는데 아름이 한테는 누구도 오지 않아서 제 우산을 같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신발주머니를 제가 챙겨 들고 아름이에게도 신발주머니를 달라고 하자 놀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주 생소한 경험을 한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집까지 들어 주겠다고 하자 슬그머니 신발주머니를 제게 맡겼습니다.
딸아이는 우산이 작아 혼자 쓰고 아름이와 제가 한 우산을 썼습니다.
우산 속에서 아름이 어깨를 껴안자 아주 작은 새처럼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아름이 사정을 몰랐던 때라 제가 아름이에게
“야, 아름이는 엄마가 품에 안기 좋겠네. 이렇게 쏙 들어오네. 우리 딸은 덩치가 커서 두 팔로 안아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아주 잠깐 몸이 굳어졌습니다.
비를 맞아서 추워서 그런가보다,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상처를.....
그 날, 하교하는 길은 아이들이 통행하기 어려울 만큼 물바다였습니다.
그 길을 빙 둘러 가면서도 딸아이가 즐거워 재잘대는 것과는 달리 아름이의 표정은 내내 어두웠습니다.
아름이는 그때도 ‘엄마’라는 사랑의 허기에 시달렸겠지요.
아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자 아름이
|